책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만나면
이북 좋아하는 친구와 종이책 좋아하는 친구로 갈린다.
그런데 나는 둘 다 좋아해.
이북은 종이를 아낄 수 있고, 여러 권 번갈아 볼 수 있어 좋고,
아무래도 종이책은 대체할 수 없는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...
그리고 무엇보다 종이책엔 싸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!
속물인가?
속물이다. (뻔뻔)
좋은 기회로 김영란 전 대법관님의 <시절의 독서>를 읽게 되어 리뷰해 보려고 한다.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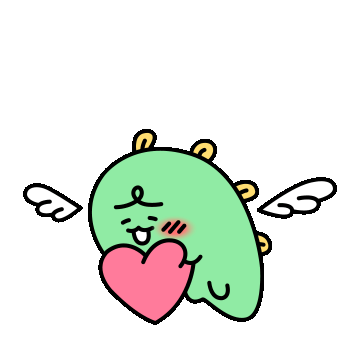

사실 이 책을 고르게 되기까지 여러 고민을 했는데,
김영란 님의 전작들 중에서는 <판결과 정의: 대법원의 논쟁으로 한국사회를 보다>를 읽었었고,
그 외에도 <헌법 이야기> 등 유명한 책들이 많아
어떤 책을 들고 싸인을 받으러 가야 할지(!)가 주된 고민이었다.
(실제로 다른 한 분은 <헌법 이야기>에 싸인을 받았다.)
한번 책을 사고 싸인까지 받게 되면 아무래도 영구소장해야 하니까
나랑 잘 맞는 책,
두고두고 소중히 할 책으로 고르고 싶단 말이지.
이렇게 화려한 표지의 책은 서점에서 보면 안 사게 되는데,
표지와 관계없이 이 책을 쓴 분이 김영란 작가님이고,
책 내용도 흥미로워 보여서 이 책으로 골랐다.
고루한 명작들을 읽어주는 이 시대의 어른이라니
낭만이 남아 있지 않은가.😊

우선 책을 읽으면서 크게 와닿은 몇 구절을 인용해 보려고 한다.
현실이 절망적이고 힘들수록 판타지는 더 강력해야 한다.
그리고 판타지는 시작이 어떠했든 간에 일단 싹이 튼 이상 그 다음에는
자기 속에서 자라나 변해간다.(p.48)
<작은 아씨들>의 작가 루이자 메이 올컷의 현실은 무겁고 힘든 책임감 가득한 것이었고,
그의 어린 시절은 상상 속 세계를 구축하는 경험으로 채워져 있었다.
그가 작가로서 그려낸 가족의 모습은 조금 더 이상적인 버전의 판타지임과 동시에
그의 힘든 현실 또한 변화시킬 능력이 있는 소중한 원동력이었다.
이에 대한 김영란 작가님의 표현이 가슴에 참 와닿았다.
누구나 1인분의 삶, 또는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기 쉽지 않고
그 삶을 버티게 하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...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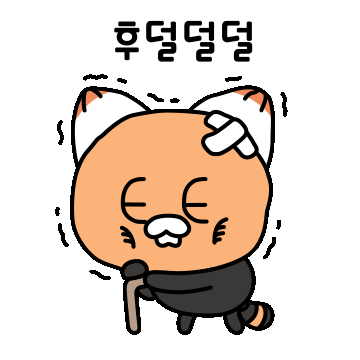
소설의 힘은 그런 데 있지 않을까?
자기의 삶에서 벗어나 가상의 세계와 등장인물의 삶을 간접경험하고,
때로는 다른 시대에 빠져들어 봄으로서
거대한 시대적 흐름과 단절된 미시적 개인이
잠시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.
학부생 때 <중부유럽의 문화와 예술> 이라는 교양과목을 들었다.
그때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
"소설만이 삶을 구원할 수 있는 거야"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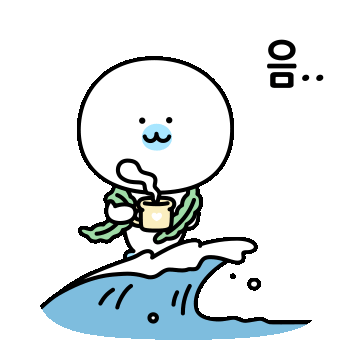
나는 그 말을 얼핏 이해한 듯했으나
진실로 받아들이기엔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.
강산도 변하고 삶에 대한 시각도 변하면서
이제서야 말하는데
교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.
<제인 에어>에서 항상 이해할 수 없었던 로체스터와 버사의 모든 것이
<광막한 사르가소 바다>에서 비로소 온전히 드러났다.
앙투아네트가 제자리를 찾는 데는 무려 120년이 지나야만 했다.(p.76)
이 부분이 인상깊었던 이유는 '크리올(식민지에서 태어난 백인)'에 대해 처음 생각해 볼 수 있어서였다.
로체스터는 본부인인 '버사'를 방에 가두어 놓고 미치광이로 묘사하며,
그녀의 존재를 숨기고 제인 에어와 결혼하려고 한다.
현대적 시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이고, 범죄이다.
그런데 당시 시대상으로는 소설 속 제인 에어가 그랬던 것처럼 로체스터와 결혼하지 않고 떠나는 것이
대단히 도덕적인 결단이었던 듯하다.
그것이 제인 에어와, 나아가 작가 샬럿 브론테가 가지는 한계였을 수 있다.
이를 비판하며 작가 진 리스(Jean Rhys)는 <광막한 사르가소 바다>에서
버사, 실은 앙투아네트의 삶에 대해 보여준다.
알고 보면 로체스터가 그의 이름을 빼앗았을 뿐, 버사는 버사도 아니다.
본명은 앙투아네트로, 크리올이란 이유로 천대받으면서도 부유한 상속녀로서 로체스터와 결혼한다.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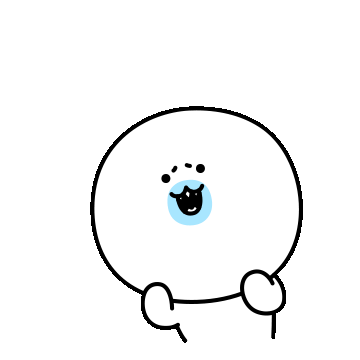
그러나 로체스터는 '버사'가 미쳤다고 생각하며 감금해 버린다.
소설 결말이 결국 로체스터에게 제인 에어가 돌아가 결혼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,
불타 죽은 '버사' 아니 앙투아네트의 삶이란 어떤가가 떠올라 고통스럽다.
<제인 에어>가 항상 와닿지 않는다고 느꼈고,
자매인 에밀리 브론테의 <폭풍의 언덕>도 혼란스러워하며 읽었는데,
<시절의 독서>를 통해 다시 만나보는 브론테 자매는
적어도 생각할 거리를 계속 던져준다는 점에서 이전과 다른 감상을 준다.
학부생 때 <서양 비극문학 읽기>라는 교양과목을 들었는데,
그때 <폭풍의 언덕>을 읽고 다소 왠지 모를 분노에 차서 감상을 발표했던 기억이 난다.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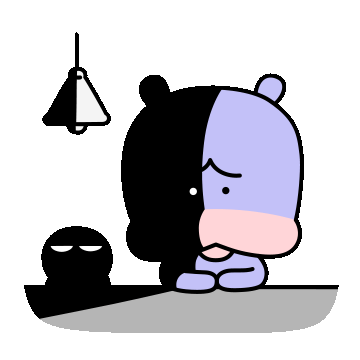
<트와일라잇>이라는 로맨스 소설의 작가는 <폭풍의 언덕>을 보고
한 여자와 두 남자 이야기에 감명을 받아 영향을 받은 소설을 썼다고 고백하기도 했다.
그처럼 <폭풍의 언덕>은 로맨스로 치부되기도 하지만
사실 읽어보면 로맨스보다는 광기어리고 황량한 자연과,
그와 닮은 통제되지 않는 인간 감정이 넘실대는
그야말로 대혼란의 소설이다.
오히려 김영란 작가님의 소개를 보며,
다시 이 책들을 읽어볼까 싶은 용기가 생기게 되었다.
지금 읽으면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...
도리스 레싱을 처음 만난 것은 1997년 번역 출판된 <황금 노트북>(The Golden Notebook, 1962)을 읽으면서였다(2019년 <금색 공책>으로 새로 번역되었다). 여성의 수가 아직도 극소수였던 법률가 사회에서 일하면서, 오로지 여자라서 일을 못 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였던 시절이었다. <금색 공책>의 여주인공 애나 울프의 이야기는 남성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고 인정받아야 한다는 원초적인 단계의 전투에서도 지쳐버린 나에게는 전혀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읽혔다.(p.122)
책을 읽으면서 쭉 느끼는데
김영란 전 대법관님(현 양형위원회 위원장님)은 본업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,
작가로서도 글을 참 잘 쓰시는 것 같다.
그리고 <시절의 독서>를 읽으면서
정말 명작을 읽어 주는 어른 여성이 곁에 있는 것 같아
마음이 따뜻해진다.
도리스 레싱이 <금색 공책>에서 애나 울프를 적극적으로 정치하는 여성으로 등장시켰기에,
많은 남성들이 '여성이 남성을 바라보는 시각'을 이 책을 통해 익혔다고 하며,
성별 대결로서 이 책을 이해하려는 시도도 있다.
그러나 정작 도리스 레싱이 다루고자 했던 주제는 '무너져버림'에 대한 것이었다고 한다.
잘못된 이분법과 분리, 그 벽과 경계가 허물어지고 무너져버릴 때
자기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.
이런 도리스 레싱의 의도와 관계없이 많은 독자들은
<금색 공책>을 여성으로서의 삶의 무기로 삼고자 했다.
후에 작가 본인도 인정했듯,
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독자들의 반응과 그 여파 또한 작품을 비옥하게 만들었다.
책을 읽으며 두서없이 떠오르는 생각들을 글로 풀어 쓰려니
작가가 얼마나 고단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지 느껴진다.
다른 사람들도 <시절의 독서>를 많이 읽고,
그들 나름의 생각들을 들려줬으면 좋겠다.😉
추천~~~💚💚💚💚💚
'책 리뷰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지구 끝의 온실, 온실 벽을 두고 오간 대화와 단절의 시간들 (0) | 2022.12.05 |
|---|---|
| [책리뷰] 적당히 가까운 사이 (0) | 2022.02.18 |
| [책리뷰] 만들고 싶은 여자와 먹고 싶은 여자 (0) | 2022.02.17 |
| [책리뷰] 틴틴팅클 <단짝 틴틴이와 팅클이의 명랑한 하루> (0) | 2021.05.04 |
| [책 리뷰]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(0) | 2021.05.02 |




댓글